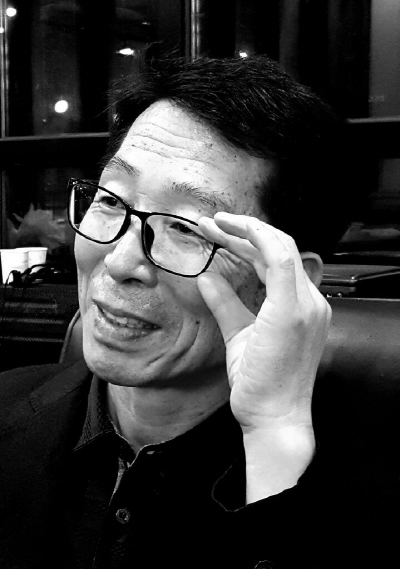저기 샷시문이 보이네
흔들린 바람이 좋은
우리 동네 골목길 모퉁이
오가며 들리는 참새 홈 마트
난 나래 없는 참새
그녀는 연분홍 방앗간
오늘도 어제처럼 출근한
바코드 찍는 여인
날씬한 몸매 싹싹한 매너
당기고 감기는 묘한 마력이 있었네
모닝커피 겨를 없이
손님들 눈빛을 찍고 카드를 찍는
활짝 핀 백합 같은 여인
그 언제쯤 뛰는 내 심장
바코드 한 번 찍을까나
서정시는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시학이다. 시는 바람의 말을 전하는 공간이다. 행간에서 일어나는 찰라의 순간을 어떻게 언어로 교직화하는 지가 관건이다. 사물의 말을 인간의 말로 환원할 때 비로소, 시가 태어난다. 언어는 공감과 소통이 중요하다. 좋은 시는 ‘가장 적은 언어로 가장 울림이 큰 시’로 변환할 때 빛난다. 시작詩作 행위는 고독하다. 특히 사랑의 감정 표현은 정묘하여야 한다. 좋은 사랑시는 좋은 느낌을 준다. 행간과 연의 느낌이 좋으면 금방 시적 분위기가 반전된다. 이런 시는 단순하고 심플한 구도에서 빛난다. 근래의 수많은 사랑시들은 말이 너무 많다. 췌사는 시의 주적이다. 시인은 ‘어떻게 시어를 잘 덜어내는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미지의 범람은 시의 정신을 헤친다. 적확한 이미지 사용은 얼마나 시를 미끈하게 하는가. 제때 제 자리에 잘 앉은 시어는 보기만 해도 좋다.
경북 의성 출생인 서철수 시인의 제1회 『문장21』 문학상 본상 수상작 「바코드 찍는 여인 」외 몇 편은, 서정의 아름다운 무늬가 잘 드러나 있다. 당선 소감은 참으로 멋지다. “소년 시절 나는, 단풍 같은 시가 되고 싶었다. 붉은 물이 든 그 가을 같은 시인이 되고 싶었다. 주옥같은 서정시를 꺼내 밤새워 읊조리곤 하였다. 이따금 나는 산 넘어 흘러가는 뭉게구름에 올라타 휘파람을 불곤 하였다. 밤늦게까지 바람을 주으러 다니다, 뒷산 숲속의 뻐꾸기 소리를 듣곤 하였다. 우연히 동네 개울가에 앉아 떠먹는 달빛은, 기가 막혔다. 꿈 많은 젊은 날,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왔다. 바쁜 공직생활로 오랫동안 시를 잊고 살았다. 퇴직 후, 어느 늦가을 공원 단풍길을 걷다가 불현듯 시가 들려왔다. 까맣게 묻혀 있던 그 옛날 시어들이 내 가슴 속에서 소곤소곤 말을 걸어왔다. 그때부터 나는 나만의 서정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싶었다. 시의 연장통을 꺼내, 밤낮으로 언어를 만지고 놀았다. 밤새워 시를 쓰다 창문 틈으로, 겨울 흰 눈이 시가 되는 풍경을 보았다. 시는 바람의 말을 전하는 노래인지 모른다. 내게 시는 석양을 고독한 내면에 채색하는 일이다. 사물의 말을 인간의 말로 소통하는 일이다. 가장 적은 언어로 가장 울림이 큰 시로 변신하는 일이다. 새벽마다 백지 앞에 앉으면, 지금도 절망한다. 단순하고 심오한 시의 요체를 언제나 볼까?”
당선작 「바코드 찍는 여인 」은, 특히, 골목 풍경의 응시와 “바코드 찍는 여인”에 대한 관찰자의 시선은 이미지를 내밀화하였다. “저기 샷시문이 보이네”란 첫 행의 시각적 감각은 독특하다. 무심코 던진 화법의 우연성과 이미지의 연상 작용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겠다. 사랑하는 여인이 “동네 골목길 모퉁이”, “참새 홈 마트”에서 일한다면, 어느 사내의 가슴인들 “흔들린 바람” 이 되지 않을까. 하여 사내(참새)는 사랑의 연분홍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 시구에서 ‘참새’와 ‘방앗간’의 비유는 해학적이고 적확하다. 젊은 남녀는 사랑을 눈으로 하지만 중년의 시인은 감성으로 하나 보다. “오늘도 어제처럼 출근한 / 바코드 찍는 여인”을 바라보며, 그녀의 “날씬한 몸매 싹싹한 매너”에 푹 빠졌다. 시인의 눈에는 고운 그녀가 “활짝 핀 백합”처럼 보기만 하여도 좋기만 하다. 하여, 그녀가 일하는 마트 주변을 서성거리며 “그 언제쯤” “바코드 한 번 찍힐까”를 고대한다.
함께 실린 시,「동박새」는 풍경과 서정을 적절히 버무린 서정시의 전형을 띤다. 동박새의 옛 이름이 수안繡眼이란 말도 곱지만, 동박새의 눈을 “꽃눈 수놓은 눈 둘레 / 하얀 패션 안경테”로 생생하게 묘사한 점은 세밀하다. 더 놀라운 점은 “시린 발끝의 여린 온기”로 동백꽃이 핀다는 기막힌 시안詩眼이다.「동박새」는 운문시의 리듬과 시적 여운이 생기발랄하다.「개망초 트롯」은 은유를 통해 사물의 태態를 드러낸다. “잡풀 가요방”에서 벌어지는 개망꽃들의 노래 경연은 참신하다. “안개 같은 젖빛 세상”에선, “인생을 잘 꺾어야” 외롭지 않는 법이다. “네 박자” 삶이야말로 금빛 올 하트가 기대되는 인간들의 희망이다. 이 시는 다채로운 꽃들의 은유를 통해 세상살이의 다양한 측면을 교섭하고 있다.「천문동天門洞」은 중국 장가계 풍경구 중 하나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수려한 풍경을 자랑한다. ‘하늘문’이라 불리는 천문동은 서기 263년 절벽이 무너지면서 생긴 구멍이다. 높이 131미터, 넓이 57미터의 거대한 석회암 천연 동굴로 유명하다. 시인은 “우르릉 꽝! 꽝”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 장쾌함을 표현하였다. 이 시는 읊을수록 호방하다. “억겁의 세월 빚은 신의 한 수”가 행간에 돋보인다. 시선 이백도 무릎을 칠 천문동의 풍경을 실감 나게 형상화하였다. 서철수의 이런 시풍은 그야말로 즉물적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준다.「핑크뮬리」는 눈부신 가을에 “파스텔톤”으로 펼쳐진 핑크뮬리를 시화한 것이다. 분홍의 그 꽃 무리 속으로 “양산 든 고혹적인 여인들의 속삭임”은 기막힌 정경이다. 아마도 그런 풍경은 “바람이 전한” 노래이자 이름일 것이다. 그 흔들리는 꽃 무리 속에서 “저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깔깔깔 웃는” 여인과 핑크뮬리는, 한 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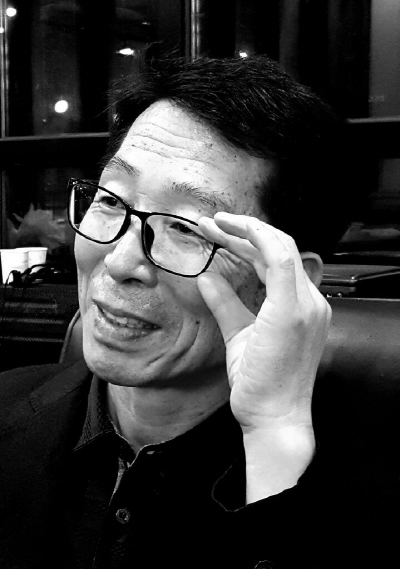 |
| 김동원 시인 |
1962년 경북 영덕 구계항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다. 1994년 『문학세계』로 등단, 201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동시, 2020년 『문장21』에 평론이 당선되었다. 시집 『시가 걸리는 저녁 풍경』, 『구멍』, 『처녀와 바다』, 『깍지』, 『빠스각 빠스스각』, 시선집 『고흐의 시』, 시 에세이집 『시, 낭송의 옷을 입다』, 평론집『시에 미치다』, 동시집 『우리 나라 연못 속 친구들』, 『태양 셰프』출간하였으며, 시평론 대담집 『저녁의 詩』를 편저했다. 대구예술상(2015), 고운 최치원문학상 대상(2018), 대구문학상(2018), 영남문학상 수상(2020)을 수상했다. 대구시인협회부회장 역임, 대구문인협회 이사, 한국시인협회원, 대구아동문학회원, 『텃밭시인학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