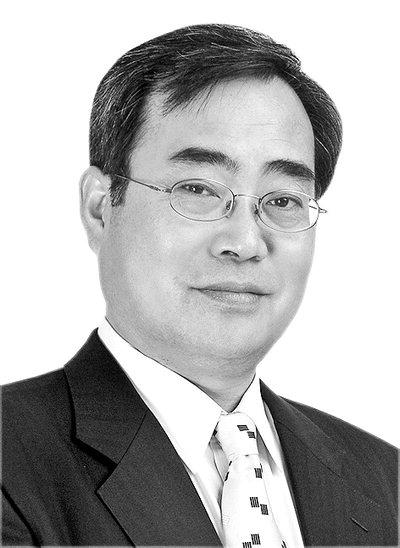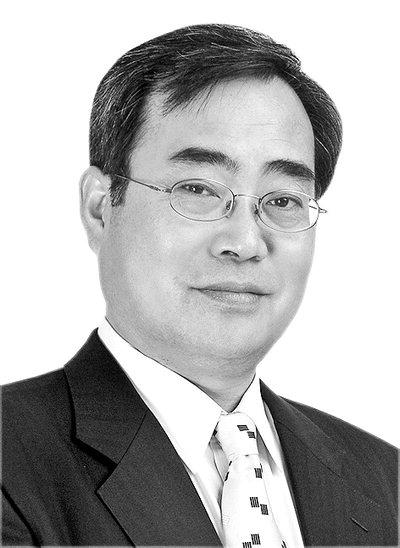 |
황태순 정치평론가
|
열흘 붉은 꽃이 없고, 십년 가는 권력이 없다. 권력의 무상함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민심의 무서움을 권력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정치가 액튼 경의 경구에, 정권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바뀔 때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카를 슈미트의 성찰을 합쳐놓은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도 4년 연임제가 제도화된 1945년 이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3기(12년)에 걸쳐 집권한 경우는 딱 한 차례다. 레이건 정부(1981~1989년)에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1989~1993년)이 그 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조차 결국 클린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1987년 9차 개정헌법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후 6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다. 그런데 그 흐름을 보면 우파정권(노태우, 김영삼)→좌파정권(김대중, 노무현)→우파정권(이명박, 박근혜)의 진자운동 형태를 보이고 있다. 어느 정부든 10년쯤 집권하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선 무엇인가 변화를 바라게 되고 이런 바람이 투표결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년 주기, 미국의 경우 8년 주기마다 정권이 바뀌는 까닭은 무엇일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에 따라 집권층이 형성되고 이 집권층은 점점 기득권 세력화되어 가기 마련이다. 정책의 결과에 따른 수혜계층과 소외계층 간의 간극이 점점 심화되어간다. 이 간극을 좁히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 격차는 점점 넓어진다. 그 결과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정권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했어도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지난해 10월24일부터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결정적 쐐기를 박았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마당에 우파정부에서 좌파정부로의 정권교체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 특히 대선의 경우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구도와 인물과 이슈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다. 지지층의 사기(士氣)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다. 우리 후보가 당선되고 남의 후보가 안 되어야 하는 분명한 정당성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지금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했을 때 보수진영은 구도, 인물, 이슈에서 다 뒤지고 있다. 우선 구도에 있어서 보수진영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어 있다. 인물도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한 사람에게 목을 매고 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과연 보수의 중심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이슈는 아예 말할 것도 없다. 탄핵정국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지지층의 사기는 한 마디로 지리멸렬이다. 전의(戰意)를 상실한 지 오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1천577만명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들 중 몇 명이나 결연한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달려가 보수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2007년 대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보수후보(이명박 이회창)가 1천505만표, 진보후보(정동영 권영길)가 688만표를 얻었다. 그 5년 후에 문재인 후보가 1천469만표를 얻은 것을 보면 당시 진보진영의 열패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다.
정치는 생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지금과 같이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러나 보수 지지층이 느끼는 모욕감을 씻어줄 수만 있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은 할 것이다.